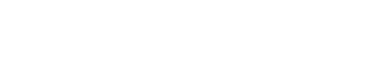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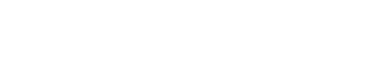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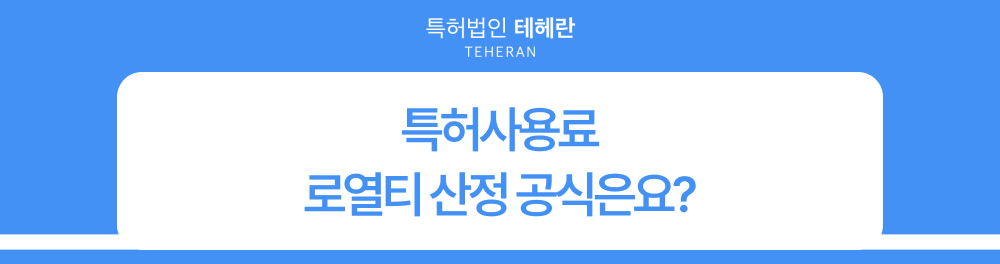
특허권은 단순히 나만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특허를 대여해줌으로써 특허사용료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사용료를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특허사용료를 명확히하기 위한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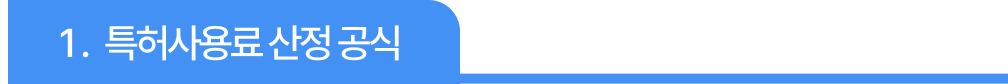
기본적으로 특허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선 다양한 변수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R: 로열티 금액
S: 매출액 또는 판매 수익
X%: 로열티 비율
I: 특허 침해 또는 사용 위험 계수
V: 특허의 유효성 또는 안정성 계쑤
Y: 라이선스 기간
위 6가지 변수들을 모두 체크하여 특허사용료를 산정해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시장 기반/소득 기반/비용 기반 3가지의 기반으로 정확한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기반의 접근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사용료를 계산하는데에 사용 되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접근법을 살펴보신 후,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에 유리한 접근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1) 시장 기반 접근법 :
시장 기반 접근법은 동일 산업 내 유사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시장 조건을 반영하기에 현실적인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유사하나 계약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 소득 기반 접근법 :
예상 이익의 25%를 로열티로 설정하는 전통적인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매출 이익이 5만 원이라면, 이의 25%인 12500원을 로열티로 산정하는 것이죠.
이는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비용 기반 접근법 :
기술 개발에 투입된 R&D 비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진 접근법으로, 시장 가치나 미래 수익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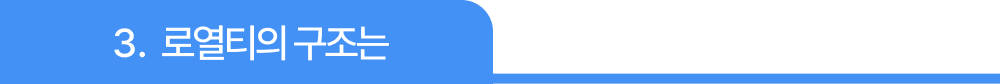
그렇다면 특허사용료 로열티는 어떠한 구조로 설정될 수 있을까요?
1) 매출 기반 비율 :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
2) 단위당 고정 금액 : 판매된 제품 단위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3) 계층형 로열티 : 판매량이나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는 비율로 지급하는 것
4) 고정 금액 : 초기 계약 시 고정된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
위 4가지의 구조로 대부분 특허사용료 로열티를 측정하는데요.
많은 기업에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인 배경과 미래의 가치 창출에 따른 변동까지 감안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다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해당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을 양지해 주셔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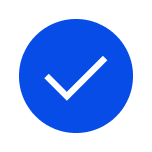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